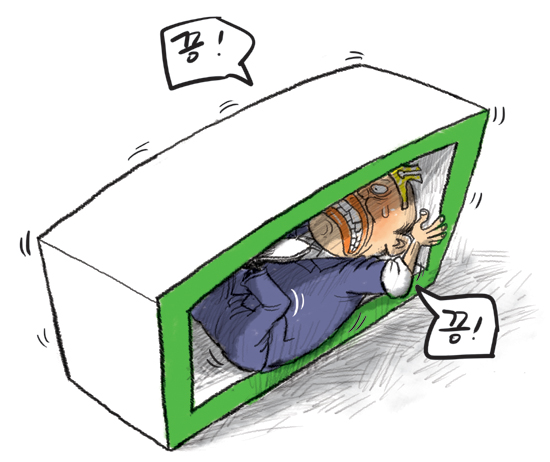어뷰징 낚시기사 써봤더니 15분만에 10만원
하루 8시간이면 160만원, 비뇨기과·성형외과·임플란트 광고와 맞바꾼 저널리즘… 불나방이 된 언론
[미디어오늘 김하영 저널리스트]
2009년 네이버가 뉴스 트래픽을 해당 언론사에게 돌려주겠다며(혹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뉴스캐스트의 링크를 '아웃 링크'로 바꿨을 때였다. 전에는 네이버에서 뉴스를 클릭해도 네이버 화면에서 기사를 보게(인링크) 돼 있었지만 '아웃링크'로 바뀌면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기사 화면으로 이동하게 됐다.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방문자가 폭증하며 서버가 마비된 것이다. 황급히 서버를 증설해야했다. 서버 사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경영팀은 즐거웠다. 트래픽이 적게는 10배, 많을 때는 1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광고 수입이 뛰었다. 호황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기자된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변화였다. 이전에 1만 정도 되던 기사 조회수가 뉴스캐스트 이후 10만, 많게는 100만 까지 뛰었다. '내 기사를 100만 명이 보다니.' 묘한 흥분과 함께 기사를 보다 잘,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런 기분 좋은 변화는 이후 독이 되고 말았다.
트래픽이 치솟자 광고 영업도 잘 됐다. 화면 곳곳, 구석구석에 광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광고의 변화 양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
||
이런 광고들 말이다. 미디어오늘도 지저분한 광고를 많이 줄이기는 했다지만 자유롭지는 못하다. |
||
첫째,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병원은 법률적 제약에 의해 지상파 등의 언론매체 광고를 할 수 없다. 인터넷 광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는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했다. 반면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광고가 인터넷 미디어에 몰려들었다. 독자들은 선정적인 광고에 눈쌀을 찌푸리지만 사실 선정적일 수록 광고 조회수는 올라갔다. 선정성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둘째, 트래픽 폭탄을 맞기 전 인터넷 미디어의 광고는 잡지로 치면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트래픽 폭탄 투하 이후 대부분의 광고는 메인 페이지가 아닌 기사 본문 화면에 집중됐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해당 기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는 광고 효과가 없던 것이다.
셋째, 기사 화면에 들어간 광고들이 처음에는 기사 외곽에 배치됐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점점 기사 본문 영역을 파고 들기 시작했다. 기사 본문을 침범할 수록 (오클릭 또는 오터치 때문이든 아니든) 독자들이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았다. 이런 광고는 단가도 비싸고 조회수도 더 많이 나왔다. 처음 '배너' 수준에 그치던 광고들은 점점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다. 갑자기 확 커져 기사 본문을 덮는 광고도 생기고 배너를 지우기 위해 x자를 누르면 광고로 넘어가는 트릭 배너도 등장했다. 안타깝게도 선정적일 수록, 지저분할 수록 광고 효과는 좋았다.
|
|
||
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선정성과 가독성 침해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더불어 기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대기업 광고 영업에 더 집중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선정적인 비뇨기과나 성형외과, 임플란트 광고에 비해 대기업 광고는 품위도 있고 깔끔하다. 배너 형태여서 기사를 가리지도 않고, 조회수에 상관없이 광고 가격이 정해져 있어 편집국에서 기사 조회수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다. 나아가 경영팀과 편집국의 광고를 둘러싼 감정 싸움도 늘어갔다.
논쟁은 싱거웠다. 대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대신 중소 규모 대행사의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급속 팽창하기 시작했고, 언론사들은 스스로 엄청난 트래픽 경쟁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다. 언론들은 어두운 밤 가로등 주변을 어지러이 맴도는 불나방이 됐다. 첫 번째 부작용은 '낚시질'이었다.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제목, '충격' '경악' 등 선정적인 문구의 제목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점잖다는 언론사들도 제목에 '?'(물음표)를 남발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어뷰징'이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따라 키워드만 바꿔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를 '어뷰징'이라고 한다.
한 번은 '어뷰징 테스트'를 해봤다. 모 대형 마트에서 '통 큰 자전거' 마케팅에 나섰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5위에 올랐다. "통 큰 자전거"를 키워드로 5분 만에 기사를 만들어 전송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통 큰 자전거"를 입력하니 내가 작성한 기사가 검색 목록 가장 위에 떴다. 관리자 시스템에서 조회수를 체크했다. 2분 만에 조회수 5000을 찍었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전송한 '통 큰 자전거' 어뷰징 기사로 인해 내 기사는 불과 5분 만에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사라졌다. 목록에서 사라진 뒤 조회수는 5분 동안 200을 넘지 못 했다. 처음 작성한 '통 큰 자전거' 기사를 조금 손을 본 뒤 다시 전송했다. 내가 전송한 기사가 포털 검색 목록 상단에 노출됐고, 조회수는 다시 치솟아 5분 동안 3000을 기록했다. 실시간 검색어 확인부터 기사 작성, 전송, 재수정, 전송 등의 작업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가량. 조회수는 약 1만 회 정도를 기록했다. '조회수 1'에 광고 수익이 1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15분 동안의 수고에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1시간 동안 이 '짓'을 2번만 해도 20만 원.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누가 마다하겠는가. 트래픽 장사 노리고 급조된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이고, 대형 종이 신문 언론사들도 자회사를 차려놓고 비정규직 인턴들을 고용해 어뷰징 장사에 나섰다. 바이라인(기자 이름) 걸고 기사 내보내기 창피한지 회사는 '디지털뉴스팀'이라는 바이라인을 걸기도 한다.
|
|
||
이렇게 인터넷 언론 불나방들이 네이버라는 이름의 가로등 아래에서 어지럽게 아귀다툼하고 있던 중,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폐지해버린 것이다.(요즘은 가로등 운영권을 아예 나방들에게 넘길 모양이다.) 트래픽은 반토막, 아니 4분의 1, 심한 곳은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트래픽의 단 맛을 본 언론사들은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 했다. 그럴 수도 없다. 법인을 만들어 조직을 꾸리고 사람까지 뽑아놨는데 하루 아침에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 온 어뷰징 기법을 더욱 가다듬었다. 인기검색어 10개를 조합해 기사를 만들기까지. 닷컴사를 만들어 트래픽 장사로 재미를 보던 언론사들은 "쟤들은 우리랑 법인이 달라요" 운운하며 나몰라라 했다. 언론사들은 스스로 괴물이 돼 갔다.
2000년대 한국 언론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의 완벽한 모델이다. 어뷰징을 하지 않는 매체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광고 시장의 특성상 광고는 트래픽이 높은 언론사에 몰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수인 양질의 콘텐츠들이 다수의 어뷰징 쓰레기들에 묻혀 존재감이 사라지고 말았다. 세간의 사람들은 이 나방들을 '기레기'라 부르게 됐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